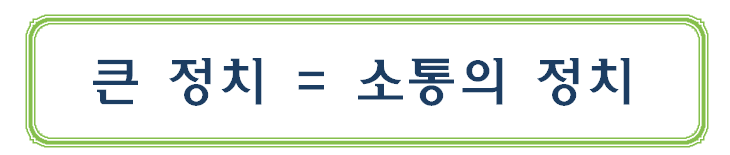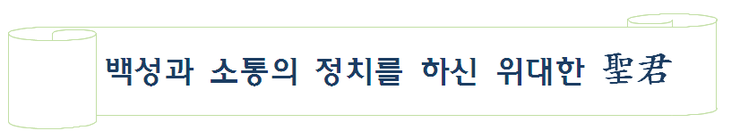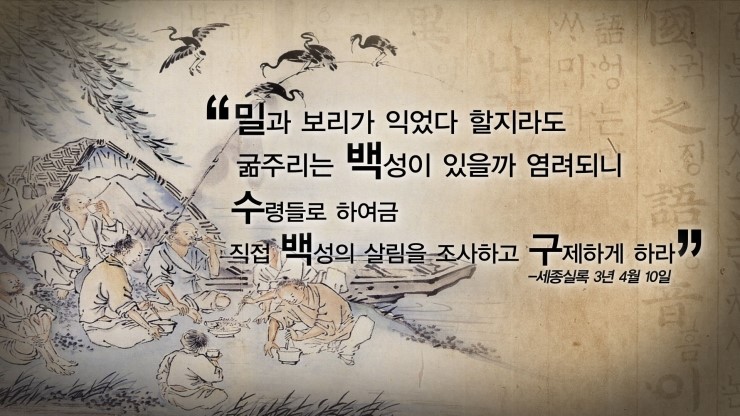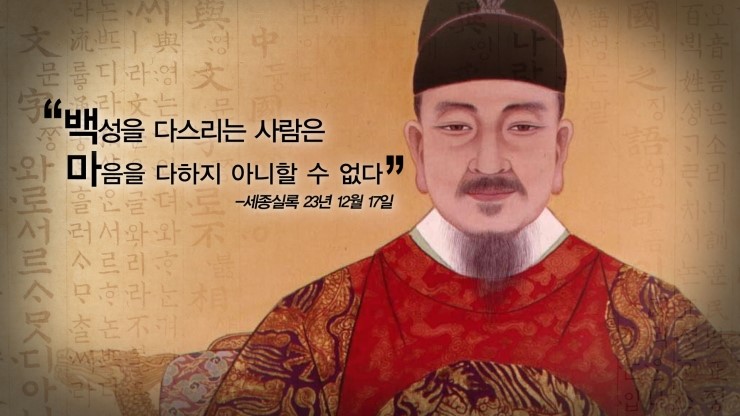극심한 가뭄에도 태평성대를 이룩하여 낸 세종대왕 

2015.03.03. 21:44
 http://blog.naver.com/cojaya/220289410065
http://blog.naver.com/cojaya/220289410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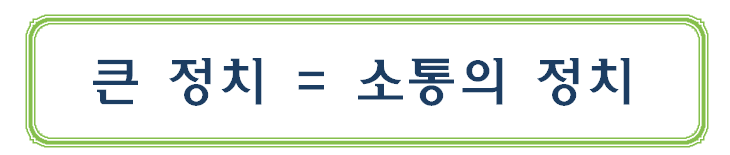
5,000년 한민족 역사에 가장 잘사는 위대한 선진국을 이룩하신 황제노인들의
절반을 빈곤하게 만든 오늘의 상황은 불통과 무배려의 사회가 寄與(기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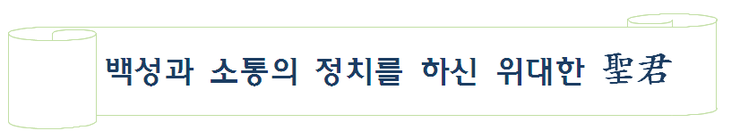
세종의 재위 초반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이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은 흙을 파내어 먹을 만큼 고통에 시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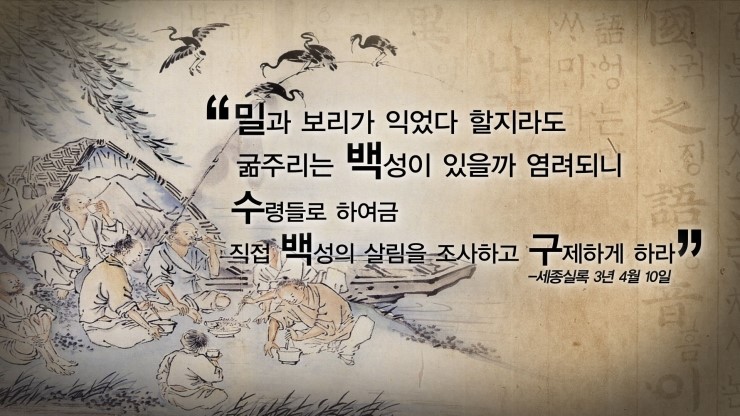
■ 극심한 가뭄에도 태평성대를 이룩하여 낸 세종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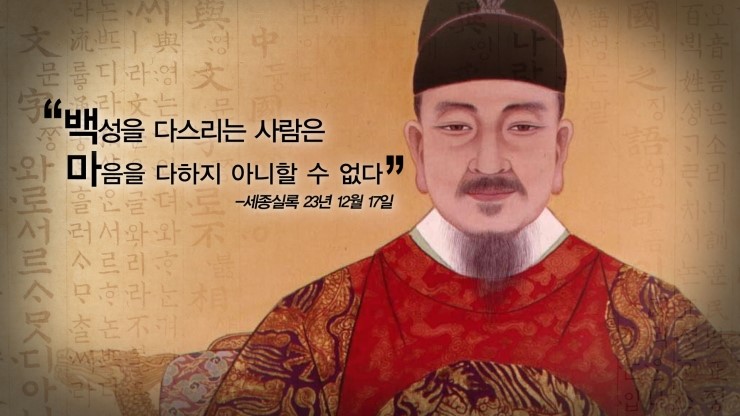
‘태평성대로만 기억되는 세종시대’
하지만 세종 재위 초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이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이
흙을 파내어 먹을 만큼 고통에 시달리자, 세종은 10여일을 앉은 채로
밤을 지새울 만큼 고민하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여......(글참조☞ 논객넷)
역사는 15세기 세종 치하의 조선을 全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의 '복지국가'였다고 말한다.

최악의 빈곤상황에 처한 조선국의 백성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태평성대를 이루는 소통의 큰 정치를 하신 世宗大王님,
모든 정치인들의 지갑에 대왕님은 계시건만 지구촌 10위권의 부자나라 대~한민국에는
소통의 큰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 없어 풍요속의 빈곤함으로 노인들은 쓰레기나 줏어서 연명합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낙서장
낙서장 
2014.05.17. 13:58
 http://blog.naver.com/parktennis/220002273477
http://blog.naver.com/parktennis/220002273477
중국 역사에서 3대 국책 문화사업이라면 명나라의 영락대전(永樂大典), 청나라의 강희자전(康熙字典)과 사고전서(四庫全書)를 들 수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영락대전은 영락제의 명으로 편찬된 백과사전이고, 강희자전은 강희제에 의해 만들어진 한자 사전의 결정판이며 사고전서는 건륭제가 국가사업으로 그때까지 간행된 책을 최대한 망라한 총서(叢書)다. 중국은 이밖에 전대 왕조의 정사 편찬과 책력, 운서(韻書)의 간행을 정통 왕조의 특권이자 책임으로 여겨왔다.
한국사에서는 어떤 국가프로젝트를 3대 문화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 고려 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한글 창제를 손꼽을 수 있을 듯하다. 고려 대장경은 고려 왕실이 거란족 요나라의 침입에 불력을 빌려 물리치려고 간행한 초조대장경으로부터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속대장경에 이어 몽골족을 몰아내기 위해 국력을 온통 기울여 판각한 8만대장경판을 두루 일컫는 총칭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27대 518년(1392~1910)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로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구한 기일과 방대한 규모, 정확한 기록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한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업적은 단연 한글 창제라는 데는 이론이 별로 없다. 다만 민족주의적 자존자대가 지나쳐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든가 ‘한글은 어떤 외부 영향도 없는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체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런 견해나 주장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은 선사시대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진화한 고대 문자는 말할 나위 없고 역사시대에 제정 또는 고안된 근대문자를 통틀어 한글이 가장 과학(음성학)적이고 철학(성리학)적인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언어학이 급속히 발달하고 표기체계가 없는 언어에 문자를 도입하는 실험이 거듭되면서 한글만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주장이 전적으로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됐다. 게다가 수학이 언어와 매우 유사한 상징체계라는 사실과 수리논리학을 기초로 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등 형식언어(Formal language)가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를 일정 부분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등장하는 ‘텡과르’ 문자 등 판타지 소설과 영화, 비디오게임을 위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언어와 문자를 문법과 어휘, 알파벳을 포함해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가상언어(Constructed language)도 잦아졌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한글의 과학성은 당대 인간지식의 최고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는 정도의 평가가 적절할 것이다.
한글에 관한 또 하나의 신화는 한글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완벽히 독창적 발명품이라는 시각이다. 조선시대 실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유래와 창제 원리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했다. 세종실록에 최만리가 훈민정음이 “고전(古篆)을 본 땄다”고 말한 기록이 있어 고전이 한자의 전자체(篆字體)라는 설과 ‘몽고전자(蒙古篆字)’의 가운데 두 글자를 뜻하기 때문에 몽골의 여러 문자 가운데 ‘파사파 문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었다. 산스크리트 문자(梵字)를 따왔다는 설과 이른바 ‘가림토 문자’와 일본의 ‘신대문자’ 등 고대문자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나왔다. 심지어 세종대왕이 왕궁의 창을 보고 창살과 창문 고리를 따서 하룻밤 새 만들었다는 설이 전해지기도 했다. 독일인 신부로 한국에서 1909년부터 20년간 선교사를 지냈던 안드레 에카르트 교수는 1932년 교수자격논문 ‘한글의 기원’에서 이런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1940년 훈민정음해례본이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면서 이런 구구한 억측은 대부분 사라졌다. 해례본의 ‘제자해’가 너무나 또렷하고 확실하게 제자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 컬럼비아대 게리 레드야드 교수같은 일부 학자들은 한글이 파사파 문자를 차용했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을 발표했다. 1980년대 들어 한글이 인도의 구자라트 문자와 닮았다는 지적과 함께 출처불명의 가림토 문자, 일본의 신대문자를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이 TV다큐멘터리와 잡지 기사를 통해 개진됐다.
그러나 신대문자처럼 후대의 위조문자이거나 가림토 문자처럼 출처불명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구자라트 문자와의 외형적 유사성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만 파사파 문자의 경우 획을 더하여 파생문자를 만드는 부분의 제자 원리와 기하학적 모양이 한글을 창제하는 데 부분적 영감을 줬을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몽골·거란·여진·서하·티베트·위구르 등 북방 유목민족의 문자를 폭넓게 섭렵, 참조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한글은 논리적 과학성과 탄탄한 철학적 토대, 뛰어난 독창성은 물론 실용성과 용이성, 역사적 생명력까지 갖춰 세계적으로 범용성이 높은 로마자(라틴 알파벳)을 제외한다면 역대 문자체계 가운데 견줄 만한 상대가 없는 독보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한글에 대해 과대·과소평가를 동시에 지양하고 흔히 갖고 있는 오해를 털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면 한글의 창제 배경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우리가 거듭 생각해 볼 한글에 대한 관점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글은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유산이라기보다 북방 유목민족들이 만들고 사용해온 다수의 고유 문자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 및 외부 학자들과의 집단 창작이 아니라 세종대왕 개인이 직접 만들었다. 셋째,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와 문화체제를 적극 지지를 표방하면서 내면적으로 민족적 자주성과 백성의 이익을 우선하는 균형 잡힌 실용정책을 구현했다.
첫 번째 관점을 살펴 보자. 세계 문자의 역사를 보면 크게 페니키아 알파벳을 비롯한 서아시아의 표음문자와 중국의 한자를 위시한 동아시아의 표의문자가 각각 전파,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페니키아 알파벳 자체도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의 표음적 요소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상당히 문자체계의 족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시아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그드 문자 영향을 받아 8세기부터 쓰인 위구르 문자를 변용한 13세기 초 몽골 문자, 몽골문자를 차용한 17세기 만주문자(청나라)다. 두 번째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든 10세기 거란문자, 거란 문자를 크게 바꾼 11세기 서하 문자와 조금만 변형한 12세기 여진 문자(금나라)다. 세 번째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7세기 티베트 문자와 티베트 문자를 약간 바꾼 13세기 말 파사파 문자다. 이밖에 고대 돌궐(투르크)족이 쓰던 오르콘 문자는 8세기에서 10세기에 쓰였고 소그드 문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글은 창제과정에서 파사파 문자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얻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위의 족보에 편입시키기에는 비길 데가 없을 정도로 독창성이 강하다. 말하자면 콘텐츠에 관한 한 거의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 문자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그 이전부터 북방 유목민족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었다. 흉노족의 문자 사용 여부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앞서 말했던 8세기 이후 돌궐족과 위구르족, 거란족. 서하족은 나라를 세운 뒤 한결 같이 고유문자를 제정했다. 그러나 본격적 발전 계기는 징기스칸이 1204년 위구르 문자를 변형해 몽골 문자로 제정한 것이었다. 그 이전 위구르 문자나 티베트 문자는 서아시아에 치우쳐 있었고 동아시아까지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현재의 몽골공화국 동부에서 시작해 북방의 여러 민족을 통합한 뒤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정복하고 동아시아의 여진족과 고려를 복속시킨 다음 결국 중국 전역을 차지한 세계 제국이었다. 당연히 그 영향력이 정복지역 전체에 미칠 수 밖에 없었다. 몽골이 쇠퇴한 이후에도 청나라처럼 유목민족이 세운 정복국가는 몽골의 본을 따서 각종 문물제도는 중국의 것을 따를지언정 한자 외에 민족 고유의 문자체계를 갖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왜 문자 창제의 물결을 좀 더 일찍 타지 않고 15세기에 이르러서야 한글을 창제하게 됐을까.
고려는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7차례 28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벌였고 1270년부터 1356년 공민왕의 반원개혁까지 몽골의 간접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고유 문자를 제정할 만 의지나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이후에도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의 급변하는 정국에서 문자 창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의제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 태조·태종대를 지나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고 국가의 뿌리가 내려진 이후에야 문물을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원래의 북방 기마민족이 남하해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국가를 세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조선시대 말 조선인의 연변 이주가 이뤄질 때까지 동아시아의 농경한계선은 대략 북위 40도였다. 한반도 서쪽에서 북위40도는 의주를 지난다. 즉 압록강 북방의 요동지방은 과거 완전한 농경지대라기 보다는 ‘반농반어(半農半漁)’와 수렵과 채취를 병행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북방유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와 농경민족화된 나라라 할 수 있고, 유목사회의 전통을 더 많이 갖고 있던 다른 북방국가에 비해 중국 문화와 문물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고려는 거란족의 요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의 원나라에 대해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그 우월감의 근거는 고려가 문화적으로 더 중국화, 즉 당시 기준으로 세계화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고려는 고유 문자체계를 굳이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는 한쪽으로는 중국의 선례와 기준에 따라 조선의 문물을 정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이 단순한 ‘소중화(小中華)’의 건설에 얽매이지 않고 북방 유목민족국가들의 포부와 의지를 상당 부분 공유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문화적 정체성’이다. 즉 세종대왕은 중국 문화의 정수를 수용한 위에다 북방민족의 기상과 위력을 얹으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에 세종대왕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본주의가 한데 어울러 태어난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다.
두 번째 관점과 관련,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가의 문제는 흔히 답이 잘못 알려져 있지만 진실은 명백하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장본인이었다. 물론 집현전 학사들이 일부 연구 조사와 취재, 확인, 해설, 해례본 간행 등의 심부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 보조 역할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역사적 기록과 다른 국책사업과의 비교다. 무엇보다 기사문의 엄정성으로 이름 높은 조선실록 세종조는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上親制諺文二十八字)‘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만약 특정 신하나 집단이 한글 창제 작업을 했다면 그들이 초안을 세종대왕에게 보고하고 인준을 받았다는 식으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 틀림없다. 세종시대의 많은 문화업적은 모두 편찬자와 작성자, 주석자가 낱낱이 기록돼있고 심지어 서문과 발문을 누가 썼는가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실제 세종대왕이 ”친히 지었다“고 기록된 것은 한글과 월인천강지곡 등 두 가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한글 친제논란은 애초 왜 일었을까. 지식인들의 좁은 소견 때문이다. 조선시대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세종이 언문청을 두어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글을 짓게 했다”는 기록한 것이 이런 방향으로 처음 나온 의견이었다.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라는 명을 내렸고 구체적 지침을 주었을망정 실제 작업은 신숙주 등 집현전 학사들이 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그러나 신숙주, 성삼문 등이 저술한 것은 ‘동국정운’이었다. 동국정운을 위해 누가 연구와 저술에 참여했는가는 명백하게 기록돼 있다. 이것은 예컨대 누가 새마을운동을 기획했는가 하는 문제와 비슷하다. 새마을운동의 계획을 처음부터 세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이었고, 그는 새마을운동 노래까지 작사 작곡했다. 대통령의 바쁜 일정에서 어떻게 기본 계획을 세울 짬을 냈겠느냐는 의문은 권력의 구조와 행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 권력자 배후의 브레인트러스트가 모든 일을 꾸몄을 것이라는 추측도 창업자형 인물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입안하는 데 있어 만주국의 ‘농촌부흥운동’에서 영감을 얻었고 장개석 대만정부의 ‘신생활운동’도 어느 정도 참고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세 번째 관점은 세종대왕의 대외 전략과 직접 연결돼 있다. 제종대왕의 재위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다. 이 기간에 명나라는 제3대 영락제(성조), 제4대 홍희제(인종), 제5대 선덕제(선종), 제6대 정통제(영종)등 네 사람의 황제가 차례로 등극했다. 영락제의 마지막 7년이 세종대왕의 초기와 겹치지만 이 가운데 첫 4년은 태종의 상왕 정치였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세종대왕의 명나라쪽 카운터파트는 인종-선종-영종 등 3대 황제였다고 봐도 좋다. 그런데 인종은 재위기간이 불과 8개월에 지나지 않았고 선종이 10년, 영종이 14년 재위한 것이 세종대왕의 통치기간과 겹쳤다. 인종과 선종의 시대는 중국사에서 ‘인선의 치’라고 해서 수 문제의 ‘개황의 치’ 당 태종의 ‘정관의 치’ 현종의 ‘개원의 치’ 청 강희·건륭의 ‘강건성세’와 함께 태평성대로 기록되고 있다.
명 태조 주원장은 과거 천하무적이었던 원나라를 무찌르고 중국을 차지한 창업주로서 중국의 군사력이 가장 강한 시대의 하나였다. 영락제 역시 다섯 번에 걸쳐 몽골을 친정하는 등 명나라의 군사력은 여전히 강했다. 이런 명나라의 힘은 영종이 환관 왕진의 건의에 따라 1449년 50만 대군을 이끌고 몽골 오이라트부를 정벌하는 친정에 나섰다가 ‘토목보의 변’을 당하고 예센의 포로가 됨으로써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이때는 세종이 승하하기 바로 전해의 일로 세종의 당뇨병 때문에 문종이 섭정으로 국사를 처리했던 시기다. 다시 말해, 세종의 재위기간 내내 명나라의 국력은 전성시대를 만났고 티무르가 죽은 이래 사실상 도전자가 없었던 기간이었다. 따라서 세종대왕은 명나라에 대해 지극히 신중하고 심려 깊은 외교를 벌였다. 반면 태종이 주도한 대마도 정벌과 세종대왕의 파저강 싸움 등 여진 토벌과 사군육진 개척으로 왜와 야인 등 주변 세력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세와 적극 외교를 병용했다.
세종대왕의 이런 전략은 군사·외교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문화적으로도 한때 몽골의 피정복민족에 불과했던 한족의 정통성과 수월성을 글로벌스탠더드로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문화에 대한 맹종이나 비굴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세종대왕은 북방 유목민족으로부터 고유 문자를 만드는 정책을 벤치마킹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문물을 이 땅의 현실에 맞게 변용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황제국의 특권이었던 책력의 반포를 칠정산 내외편 역서의 간행으로 격을 맞췄을 뿐 아니라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준을 중국이 아니라 한양으로 잡아 주체성을 다잡았다. 중국의 ‘천자’만 소유할 수 있었던 시간 측정장치와 천문관측기구를 만든 것은 물론 중국에서 사라져가던 아악을 정비하고 향악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다른 두드러진 예는 아마 ‘향약집성방’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떨어져 있어, 국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물들을 구하기 어렵다. 우리의 풍속에 간간이 한 풀로써 한 병을 치료하여 효과를 많이 보았다. … 이에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형이 태조의 뜻을 받들어 제생원을 설치하기를 청하고 김희선을 시켜 향약을 채취하여 백성이 병을 널리 치료하게 하며 또 각 도에 의학원을 두어 교수를 보내어서 시료하게 하고…….” 조선 초의 석학 권근이 쓴 서문의 내용이다.
그러나 모든 서문, 발문 가운데 발군은 역시 세종대왕이 직접 쓴 훈민정음의 서문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는 세계의 봉건왕조 그 어떤 황제왕공이 내린 칙유보다 명문이다. 그러면서 동국정운을 펴낼 때는 한자음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한글을 창제해 민족적 자주성과 국민적 편의를 드높이면서 동국정운으로는 나라의 어음을 중국의 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표방했던 것이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볼 때 문화보편주의와 민족 자주의식을 슬기롭게 조화시킨 군주였다. 손자병법에서 ‘정병’과 ‘기병’을 구사하듯 명분과 실익을 교차시켰기 때문이다. 일부 지식인들은 조선 후기의 정조가 개혁군주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조가 ‘문체반정’에서 드러나듯 개혁을 내세워 실은 보수회귀를 꾀한 ‘반동적 집권자’였다면 세종대왕은 정통을 내세워 개혁을 이루고자한 계몽군주였다고 할 수 있다. 세종이 추구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어우러진 문화적 정통성은 우리 시대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세종대왕 집현전 설치
세종대왕이 1420년 오늘 집현전을 설치했다.
집현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경연과 서연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경연은 왕과 유신이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자리로 국왕이 유교적 교양을 쌓도록 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서연은 왕이 될 세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집현전관은 외교문서 작성도 하고 과거의 시험관으로도 참여했으며 집현전이 궁중에 있고 학사들이 문필에 능하다는 이유로 그들 중 일부는 사관(史官)의 일을 맡았다.
그리고 중국 고제(古制)에 대해 연구하고 편찬사업을 하는 등 학술사업을 주도했다. 세종은 학사들의 연구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많은 전적(典籍)을 구입하거나 인쇄해 집현전에 보관시키는 한편, 재주 있는 소장학자에게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특전을 베풀었다.
세종 20년대부터 집현전은 정치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37년의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 기관이지만 조선의 학문적 기초를 닦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많은 학자적 관료를 배출해 세종대뿐 아니라 이후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했다. 후에 집현전과 같은 기능은 홍문관에서 대신하게 됐다.
집현전[ 集賢殿 ]
조선 전기 학문 연구를 위해 궁중에 설치한 기관. 집현전 제도는 중국에서 연원한 것으로서 한(漢)나라 이래 있어 왔다. 그러나 제도가 정비된 시기는 당나라 현종 때로서, 학사(學士)를 두고 시강(侍講 : 강의)·장서(藏書 : 책의 보관)·사서(寫書)·수서(修書)·지제고(知制誥 : 왕의 교서 등을 지음)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도 오래 전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이미 삼국시대에 유사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집현전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인종 때이다. 연영전(延英殿)을 집현전으로 개칭하고 대학사(大學士)·학사(學士)를 두어 시강 기관(侍講機關)으로 삼았지만, 충렬왕 이후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정종 때 집현전이 설치되었으나, 얼마 뒤 보문각(寶文閣)으로 개칭했고, 이것마저 곧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건국 이래로 표방해온 유교주의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유교주의적 의례·제도의 확립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였고, 대명사대관계(對明事大關係) 또한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므로 두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문풍(文風)의 진작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1420년(세종 2) 집현전을 궁궐 안에 설치하게 되었다.
〔직제〕
설치 당시의 직제는 영전사(領殿事, 정1품)·대제학(大提學, 정2품)·제학 (提學, 종2품) 각 2인, 부제학(副提學, 정3품)·직제학(直提學, 종3품)·직전(直殿, 정4품)·응교(應敎, 종4품)·교리(校理, 정5품)·부교리(副校理, 종5품)·수찬(修撰, 정6품)·부수찬(副修撰, 종6품)·박사(博士, 정7품)·저작(著作, 정8품)·정자(正字, 정9품)를 두었다.
이 중 제학 이상은 겸직으로서 명예직이었고, 부제학 이하가 전임관, 즉 전임학사(專任學士)였다. 따라서, 집현전의 실무 책임자는 부제학으로서 행수(行首)라고도 하였다.
집현전의 전임관, 즉 학사의 수는 설치 당시에는 10인이었다. 그러다가 1422년에는 15인, 1426년에는 16인, 1435년초에는 22인, 그 해 7월에는 32인으로 점차 늘었으나, 1436년에 20인으로 축소되어 고정되었다. 자격은 문사(文士)여야 했고, 그 중에서도 재행(才行)이 있는 연소한 자를 적임자로 삼았다. 한편, 약간 명의 서리(書吏)를 배속해 행정 말단의 실무를 맡도록 하였다.
집현전은 설치 동기가 학자의 양성과 문풍의 진작에 있었고, 세종도 그와 같은 원칙으로 육성했기에 학구적인 특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종대에는 일단 집현전 학사에 임명되면 다른 관직으로 옮기지 않고 그 안에서 차례로 승진해 직제학 또는 부제학에까지 이르렀고, 그 뒤에 육조나 승정원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직인 학사들의 연구에 편의를 주기 위해 많은 도서를 구입하거나 인쇄해 집현전에 모아 보관하는 한편, 휴가를 주어 산사(山寺)에서 마음대로 독서하고 연구하게 하였다. 그 밖에 여러가지 특권을 주어 불편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우수한 학자들이 집현전을 통해 많이 배출되었다.
〔활동 및 변천〕
집현전은 학문 연구 기관으로서 제도적으로는 도서의 수장(收藏: 수집과 보관)과 이용의 기능, 학문 활동의 기능,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집현전의 기능과 성격은 37년이라는 짧은 존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변화를 보이며, 대체로 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기〔1420년(세종 2)∼1427년(세종 9)〕는 활발한 활동은 없었으나, 전시기를 이끌어나갈 대부분의 기능이 마련되었고, 학문적 수련을 쌓아 자기 충실을 기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집현전은 경연관(經筵官)·서연관(書筵官)·종학교관(宗學敎官)·강서원관(講書院官)으로 시강과 왕실 교육 담당, 사대문서(事大文書)의 작성, 가성균관직(假成均館職 : 성균관의 임시 관직)으로서 명나라 사신의 접대, 사관(史官)으로서 사필(史筆 : 역사를 기록) 담당, 시관(試官)으로서 예조와 더불어 과거 주관, 지제교(知製敎)로서 사명(辭命, 敎命 : 왕이 내린 명령)의 제찬(制撰), 국왕의 사자(使者)로서 치제(致祭 : 제례를 행함)·사장 환급(辭狀還給 : 각종 공문의 전달과 접수)·사신 문안(使臣問安)·반교(頒敎 : 왕의 교시의 반포), 풍수학관(風水學官)으로서 풍수학 연구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제2기〔1428년(세종 10)∼1436년(세종 18)〕는 집현전의 정원이 16인에서 32인까지 증가되었다. 기능 또한 확대되어 유교주의적 의례·제도·문화의 정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고제 연구(古制硏究)와 편찬 사업을 시작해 가장 활기찬 시기였다.
의례·제도의 상정(詳定)을 위한 고제 연구에는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도 함께 참여하였다. 그런데 집현전의 고제 연구의 특징은 ① 의례·제도의 근본적인 것을 상정하기 보다는 의례·제도의 실제상에 생기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많았다는 점, ② 수시로 당면하는 정치·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③ 세종의 독단적인 시책 강행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 즉 중신의 반대에 부딪쳤을 경우에 이를 물리쳐 자기의 소신을 관철시키고 명분을 세우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편찬 사업은 집현전의 빼놓을 수 없는 업적으로 조선 초기 문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편찬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치에 귀감이 되고 후세에 영감(永鑑)하기 위한 우리 나라와 중국의 각종 사서의 편찬과 주해 사업이었다.
그 결과는 ≪치평요람 治平要覽≫·≪자치통감훈의 資治通鑑訓義≫·≪정관정요주 貞觀政要註≫·≪역대병요 歷代兵要≫·≪고려사≫·≪고려사절요≫·≪태종실록≫·≪세종실록≫ 등이었다.
그리고 조선 사회의 유교화를 위해 유교 윤리서인 ≪효행록 孝行錄≫·≪삼강행실 三綱行實≫ 등을 편찬했고, 국가의 유교적 의례 제도의 정리 사업인 ≪오례의주상정 五禮儀注詳定≫·≪세종조상정의주찬록 世宗朝詳定儀注撰錄≫ 등도 이루어졌다.
특히 훈민정음의 창제와 이에 관련된 편찬 사업인 ≪운회언역 韻會諺譯≫·≪용비어천가주해 龍飛御天歌註解≫·≪훈민정음해례 訓民正音解例≫·≪동국정운 東國正韻≫·≪사서언해 四書諺解≫ 등은 우리 나라의 문화 유산으로서 귀중한 것이라 하겠다. 집현전의 이 같은 고제 연구와 편찬 사업은 세종대의 황금시대를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제3기〔1437년(세종 19)∼1455년(세조 2)〕는 집현전의 정원이 20명으로 축소 조정되고, 집현전의 정치상의 지위 상승으로 점차 정치성을 띠는 전환기였다.
집현전은 학문 연구 기관이었기에 조선 초기 정치 권력 구조 안에서의 지위는 높은 편이 못 되었다. 그러나 1442년(세종 24) 세종의 신병으로 인해 세자의 정무 처결 기관인 첨사원(詹事院)이 설치되면서 집현전 학사들은 종래 맡아왔던 서연직(書筵職)과 함께 첨사원직까지도 거의 전담하게 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언론 활동이 활발해져서 강력한 언론 기관의 성격을 띠어 언관화(言官化)되었고, 국가 시책의 논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 활동도 활발해져서 정치 기관화되었다.
더욱이 문종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집현전 학사의 대간(臺諫)으로의 출입이 잦아져서 집현전이 대간 차출의 본거가 되어 호간고론(好諫高論 : 바른 말을 좋아하고 높은 수준의 논의를 함)적인 집단으로 변하였다. 즉, 집현전의 학문적인 성격에 질적인 변화가 왔던 것이다.
집현전의 이같은 호간고론화는 세조의 무단(武斷 : 무력으로 억압함)적인 왕권 강화책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56년(세조 2) 6월에 일부 집현전 학사와 그 출신자들이 주동이 되어 집현전에 모여서 단종 복위를 도모한 이른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집현전이 혁파되었다. 그러나 성종 때 집현전의 후신으로 홍문관(弘文館)이 설치되었다.
〔의의〕
집현전은 비록 3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한 기관이었지만 역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출신들이 세조∼성종대에 현직(顯職)·요직을 차지하면서 집현전 재직 중에 독서와 고제 연구(古制硏究 : 옛 제도를 연구함) 등으로 쌓은 경륜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사실상 세조∼성종대에 정치적으로 크게 활약한 자들은 집현전 출신이었고, ≪경국대전≫ 편찬 등과 같은 당시의 제도 확립에 공헌한 학자들도 대부분 집현전 출신이었다. 또한, 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해 조선 사회의 유교화에 크게 공헌한 것도 집현전이었다.
요컨대 조선 초기, 특히 세조∼성종대에 정치·제도·문화 등의 상부구조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거의 집현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네이트 백과사전


|
‘성군’ 또는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세종(世宗, 1397~1450, 재위 1418~1450)은 이순신과 더불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당대에 이미 ‘해동요순’이라 불려 지금까지 비판이 금기시되다시피 했으며, 초인화·신화화된 부분마저 있다. 그러나 신격화의 포장을 한 겹 벗겨버린다 해도 세종이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고 후대에 모범이 되는 왕이었다는 사실에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 |
태종의 전격적인 결단,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다

|
1418년 6월 3일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은 세자 이제를 폐하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았다. 태종은 [태종실록]을 통해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대소신료가 청하였기 때문에” 세자를 폐하고, 반면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자못 학문을 좋아하며, 치체(治體, 정치의 요체)를 알아서 매양 큰일에 헌의(獻議, 윗사람에게 의견을 아룀)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기에 왕세자로 삼는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두 달 뒤 태종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앉았다.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까지 군사 문제는 직접 결정하고 국가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6조, 그리고 상왕이 함께 의논한다는 조건부 양위이긴 했지만 전격적인 결단이었다.
그렇게 조선 제4대 왕에 오른 세종의 나이는 당시 스물 둘. 어린 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갑자기 왕세자로 책봉되는 바람에 준비가 부족했다. 집권 초기 대부분의 사안에 “상왕의 뜻이 이러하니” 또는 “상왕께 아뢰어보겠소.”라는 말을 반복해야 될 만큼 어려운 입장이었다. 엄한 아버지의 테스트를 받는 갑갑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세종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무섭게 공부하며 그 시절을 보냈다. | |
|
|

세종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고, 후대에 모범이 되는 왕이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출처 : David Hepworth at ko.wikipedia.com> | |
호학의 군주, 책 속에서 길을 찾다

|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책을 읽어대던 호학의 군주이다. 세종의 독서는 유학의 경전에 그치지 않았다. 역사?법학?천문?음악?의학 다방면에서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쌓았다. 본인 스스로 경서는 모두 100번씩 읽었고, 딱 한 가지 책만 30번을 읽었으며, 경서 외에 역사서와 기타 다른 책들도 꼭 30번씩 읽었다고 했다. “몹시 추울 때나 더울 때에도 밤새 글을 읽어, 나는 그 아이가 병이 날까 두려워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하였다. 그런데도 나의 큰 책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는 태종의 말이 전할 정도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비교하는 능력까지 갖추었다. 사실 세종은 그저 경전의 문구나 외워 잘난 척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 내용과 이치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더 깊은 생각을 하라고 학자들에게 주문하고는 했다.
1422년 태종이 죽고 재위 4년 만에 전권을 행사하게 된 세종은 태종이 만들어놓은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태종이 잡아놓은 국가의 골격을 완성해나가는 방법으로 세종이 택한 방법은 매우 학구적이다. 선현의 지혜를 신뢰했던 세종은 우선 유학의 경전과 사서를 뒤져 이상적인 제도를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골격만 갖춰진 제도를 세부사항까지 규정해나갔다. 작은 법규를 하나 만들 때에도, 그 제도에 대한 역사를 쭉 고찰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다. | |
조선의 제도와 학문, 예술의 기틀을 잡다

|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다. 우선 제도 연구의 기본이 되는 사서들이 부족하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세종은 [고려사]?[고려사절요]를 비롯한 사서들이 더 정확하고 풍요로워지도록 학자들을 다그쳤다. 중국의 사서도 열심히 연구했다. 대표적인 역사서인 [자치통감] 완질을 구해 읽고 학자들을 동원해 이에 대한 주석서인 [자치통감훈의]를 편찬했는데, 이 주해본은 중국에서 간행된 것보다 완성도가 더 높다는 평을 들었다. 경전과 사서에서 찾아낸 제도를 적용하려면 우리 땅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다. 세종은 지방관들에게 각 지역의 지도?인문지리?풍습?생태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수합하여 편찬했다. 많은 자료를 간행하려다 보니 인쇄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세종 치세에 인쇄 속도가 10배로 성장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세종 혼자 연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세종은 집현전의 연구기능을 확대해, 정인지?성삼문?신숙주 등 당대의 수재들에게 연구를 분담시켰다. 이렇게 해서 윤리?농업?지리?측량?수학?약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편찬하고, 관료?조세?재정?형법?군수?교통 등에 대한 제도들을 새로 정비했다. 이때 정해진 규정들은 나중에 조선에서 시행된 모든 제도의 기본이 되었다. 세종은 과학기술과 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세종 초에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운관을 설치했으며, 혼천의?앙부일구?자격루를 만들어 백성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박연을 등용해 아악을 정리하고 맹사성을 통해 향악을 뒤받침하여 조선에 적합한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 | |
세종의 위대함은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었다

|
세종은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세종이 위대한 성군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한 어진 왕이었다. 세종은 백성들에게 자주 은전을 베풀었고, 사면령을 빈번히 내렸으며, 징발된 군사들은 늘 기한 전에 돌려보냈다. 노비의 처우를 개선해주기도 했다. 주인이 혹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고, 실수로라도 노비를 죽인 주인을 처벌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겨우 7일에 불과하던 관비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렸고,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었으며 출산 1개월 전에도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왕이 너무 관대하면 백성들이 요행수를 바라게 된다며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세종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다. 관대하고 은혜로운 왕이었다. 훈민정음 창제도 이러한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었다. | |
|
|
|
|
사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거의 없다. 세종 최대의 업적이면서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창제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전하지 않는다. 심지어 세종 단독 작품인지 집현전 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엄청난 반대를 예상한 세종이 비밀리에 작업한 일이기에 그럴 것이다.
단.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문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린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을지나, 따로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으로 번역하여 민간에게 반포하여 우부우부(愚夫愚婦)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세종의 말과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를 청단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훈민정음 서문에 정인지가 쓴 글을 종합하여 훈민정음 창제의 실제 목적을 짐작해볼 뿐이다. | |
정신을 따라오지 못한 육체의 한계

|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초인적인 연구를 해나가다 보니 세종은 일찍부터 육체의 한계를 느껴야 했다. 30대 초반부터 풍질이 발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40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하루 종일 앉아서 정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나빠졌다. 스스로 “체력이 딸리니 생각이 이전처럼 주밀(周密)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장면도 보인다. 1440년부터는 독서도 거의 못했던 듯하다.
집권 후반기에 세종은 태종이 마련한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인 육조 직계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개편하고 세자에게 서무를 결재토록 해, 왕에게 집중되었던 국사를 분산시켰다.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집현전을 통해 배출된 많은 유학자들로 인해 자신의 유교적 이상을 실현시켜줄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는 신권과 왕권이 조화된 유교적 왕도정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공적이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면서도 새로 편찬된 책들을 수십 권씩 직접 검토하던 세종은 1450년 2월 54세로 세상을 떠났다. 정비 소헌왕후 심씨를 비롯해 여섯 명의 부인에게서 18남 4녀를 두었다. | |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종대왕의 진실| ㆍ
신채호 조선상고사 | 조회 1355 |추천 7 | 2014.10.10. 23:19

지난 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과 가장 자랑스러운 일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세종대왕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한글창제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정확하게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아니고 재위 중에 실명하게 되는데, 즉 중도실명이었던 것.
세종대왕은 안질에 걸려 시력이 점점 약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였다.
그래서 세종 23년(1440년)에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정사를 돌볼 수 없다며
세자에게 전위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신하들이 울면서 만류했다고 세종실록에 전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그 후에도 서너차례 보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세종대왕은 중도실명자였지만 그의 시각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임금이었고, 또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맹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한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세종 18년(1435년)에는 시각장애인 지화에게 종3품 벼슬을 주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청인 명통사에 쌀과 황두(콩)를 주어 시각장애인을 지원한 기록도 있다.
또한 궁중 내연에서 연주를 맡았던 관현 맹인이 가장 대접을 받았던 때도 바로 세종시절이었다.
세종대왕이 이토록 시각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은 자신의 시각장애 때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