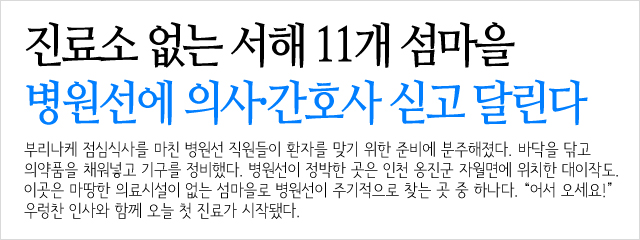
“침을 좀 맞고 싶네요.” 배 위에 오른 최서훈 할머니가 선실에 들어오기 무섭게 말을 건넸다. 한 손으론 허리를 부여잡은 채였다.
7월 24일 오후 대이작도는 바닷물이 평소보다 많이 빠져 갯벌이 유달리 넓게 펼쳐졌다. 그 기회를 놓칠까 최 할머니는 오랜 시간 쭈그리고 앉아 바지락을 캐고 왔다. 할머니를 진료실에 눕힌 한방과 진료의 채승석씨는 침통을 꺼냈다. 능숙한 솜씨로 바지락 캐기에 고단했을 허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진료가 끝난 후 할머니는 개운한 표정을 지었다. “섬마을에선 꿈꾸기 힘든 한방 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 참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주 대이작도·소이작도·승봉도를 도는 병원선 ‘인천 531호’의 2박3일 치료 여정이 시작됐다.
인천시 옹진군이 운영하는 병원선 ‘인천 531호’의 진료는 변변한 진료소 한 곳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1999년 7월부터 시작됐다. 보건진료소도 없는 소이작도·문갑도·울도 등을 포함한 11개 섬을 찾아 섬마을주민의 건강을 돌본다.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먼 거리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뭍에 나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생업을 하루이틀 놓아야 하는 처지라 엄두를 못 내는 주민들도 많다. 병원선 식구는 황정진 선장을 비롯한 기관장·항해사 등 선박 담당이 7명, 의사 3명, 간호사 2명으로 총 12명이다. 한방·내과·치과 진료실과 방사선실·약국 등의 시설을 갖췄다.
보름여 만에 병원선을 본 대이작도 주민들은 한방·내과·치과에 걸쳐 두루 진료를 받은 후 돌아갔다. 대이작도 남자주민 중 86세로 최고령인 강수씨는 치과 진료의 김영서씨에게 치석 제거를 받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황 선장이 “당뇨로 고생하셨으니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유하자 피 검사도 이어졌다. 서은영 간호사가 강씨의 팔목을 잡고 채혈했다.
강씨는 “마을 보건소 하나뿐인 대이작도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전부 무료다.

외지인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에 말벗이 돼 주기도
거동이 불편한 마을 주민을 위해 직접 방문 진료도 한다. 이날 오후 황 선장과 병원선의 의료진은 무릎 관절이 아파 고생하는 배태흥씨의 집을 찾았다. 배씨가 의료진을 반기며 “최근 변비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청진기를 든 심씨가 그를 소파에 눕혀 진료를 시작했다. 심씨는 “장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다”며 약을 처방했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파스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배씨는 “주기적으로 찾아와 건강을 돌봐주는 병원선이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돌봐온 덕분에 병원선은 섬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치료기관 이상이 됐다. 황 선장은 “병원선이 도착하는 날이면 친한 섬마을 주민들이 술·음식을 준비해 함께 먹자며 반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전 내내 기관실에서 대이작도를 지긋이 바라보던 선장은 “마을 이장이 오랜 친구인데 얼마 전 암에 걸려 집을 비운 지 오래됐다”며 “집에 들러 자란 풀들을 좀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섬에 도착해서도 병원선 직원들은 마을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몇몇 항해사는 마을 주민들이 캐낸 바지락 꾸러미를 직접 옮겨주기도 했다. 외지인을 접하기 어려운 섬마을 사람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며 말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섬마을 주민과의 잊지 못할 추억도 많다. 절반이 넘는 인생을 배 위에서 보냈다는 황 선장은 1999년 첫 출항 당시 이야기를 들려줬다. 자월도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해 위급한 50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응급 이송을 위한 헬리콥터도 없는 상황이었다. 새벽 시간에 태풍주의보까지 내린 상황이었지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배를 몰았다. 왕복 3시간에 걸쳐 위험천만한 항해를 한 후 응급환자를 육지로 옮겼다.
연평도 포격도발 때는 방공호에 갇힌 마을 주민들을 위해 섬을 찾아 위기에 빠진 환자를 돌보기도 했다.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한방의 채씨는 “평생 동안 안 씻었다는 섬마을 주민 한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배를 댈 곳이 없어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려 잠을 청할 때도 있다. 하지만 병원선 직원들은 뿌듯하다. 진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섬마을 주민들을 유일하게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내과의 심씨는 “관절염·고혈압·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찾아 치료하고 약을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방의 채씨는 “조금만 치료해 드려도 매번 고맙다고 말씀하신다”면서 “변변히 치료받을 곳도 없는데 병원선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하실 때 보람이 크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글·남형도 기자 / 사진·김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