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취업종편학교'가 된 세상…대학과 언론의 '甲질'
[변상욱의 기자수첩] 노컷뉴스 입력 2013.05.10 14:36 수정 2013.05.10 14:42[CBS 변상욱 대기자]
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대학의 국어국문학과가 폐지되고 있다. 이번 주 들어 대전의 배재대학교가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한국어문학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학률이 줄고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를 개편하다보니 그리 됐다고 한다.
한국어문학과로 통폐합되지만 한국어과는 외국학생에게 외국어인 한국어를 가르치던 학과이다. 신입생들은 입학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국문과는 2006년 광운대, 논산의 건양대, 청주의 서원대 등에서도 폐지 내지 논란을 겪고 일부는 통폐합됐다.
◇종합대학? 취업종편대학입니다
더 살펴보니 최근 대학들의 학과 통폐합에 분명한 흐름이 있다. 심리학과 철학은 엄연히 다른데 '심리철학과'였다. 아예 이번엔 '심리철학상담과'로 바뀐다. 정치언론학과는 뭘까? 권언 유착을 다루나? 이 과는 '정치언론안보학과'로 둔갑할 예정이다. 법학부는 '공무원(?)법학과'로 업그레이드된다. 불문학과 독문학과는 폐지다. 결국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취업준비가 절실하다는 결정이다.
요즘 대학들이 이런다. 순수학문을 외면하고 취업 위주로 학과와 커리큘럼을 조정할거라면 '종합대학교'가 아닌 '취업종편대학'이라고 부를 일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평가에서 취업률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거기에 학부모.학생들도 취업을 위한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면 대학은 교육의 목표와 철학, 깊이보다 뒤떨어진 점수 채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를 역행하는 교수는 바보가 된다. 논문을 하나 더 쓰거나 정부 프로젝트를 하나 더 따오는 게 인정받는 길이다. 아니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나가거나 정치권을 들락거리며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꿈꿀 것이다.
그런데 언론사들도 대학들을 놓고 1등 2등 순위를 매긴다. 이건 뭘까? 언론사가 대학의 순위를 정하려는 이유는 돈벌이 때문이다. 그러다 참다 못 한 대학들이 똘똘 뭉쳐 들고 일어섰다.
201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냈다. 평가의 전문성·타당성도 부족하고, 대학의 획일화·서열화를 조장하며 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마디로 '을'의 항변이다. 그러면서 대학을 서열화하는 대학평가에 협조할 수 없으며 순위발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똘똘 뭉쳤다.
그러자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2011년부터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대학생 스스로가 평가한 '대학 순위 - 재학생 대학만족도'가 그것이다. 마치 소비자 고객만족도와 비슷하다. 언론사가 대학을 서열화하는 게 부당하다 하니까 소비자인 대학생이 직접 평가한 거라고 포장을 바꾼 것이다.
이런 대학 서열 평가가 기준이 되어 명문대와 시원찮은 대학으로 구분된다면 타당한 것일까? 이런 대학 서열화가 언론에 보도된 걸 읽고 학부모들은 우리 자식 대학 잘 갔다, 못 갔다하며 자랑도 하고 낙심도 한다. 잘난 부모 시원찮은 부모가 된다.
◇언론은 대학에게 갑(甲)이다
이리 비판하면 대답은 뻔하다. 선진국도 다들 한다고 발뺌을 할 것이다.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1983년 미국의 <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 > 가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대학의 명예와 재산, 특권에 의해 좌우되는 평가라고 비판받는다. 대학 평가 사업은 그 후 <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 > , < 워싱턴 먼슬리 > , < 포브스 > 등 여러 미국 언론사들이 나서며 대학, MBA,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확대됐다.
'더 타임스' 등 영국 신문사들도 대학평가 사업을 한다. 역시 특정 분야 연구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려도 성적은 나쁘고 서열에 매달리게 만든다고 비판 받는다. 신문 팔려고 하는 것이지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구촌 대학 평가 사업도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 전문출판사인 'THE'(Times on Higher Education)와 고등교육전문 리서치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세계대학 순위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다 부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그들의 동업은 깨졌다.
결론적으로 대학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릴 이론적 연구나 근거, 조사 방법도 마땅치 않은데 주로 대학의 위세나 여론의 평판, 시류에 따르고, 대학의 고유한 특성들을 평가해 내지 못한다는 게 공통된 비판이다. 그래서 유럽대학연합의 2011년 '국제대학 순위평가와 그 영향 보고서'도 국제 대학순위평가의 여러 위험성을 경고했다.
언론과 기관들이 밝힌 세계 대학 순위를 종합 분석한 이 보고서는 평가기관이 ▲'대학도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평가기준도 단순빈약'하고 이 평가를 ▲'철저한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결정했다. 미국 일부 대학들도 보이콧에 나섰고, 캐나다도 평가에 불참한다는 일부 대학들의 선언이 있었다. 상위에 링크되는 대학들은 대개 모른 척 한다.
우리의 문제는 더 근원적이다. 사회가 학연으로 똘똘 뭉쳐 학벌과 파벌을 구성한다. 갈팡질팡 대입제도로 부실대학이 즐비하다. 학생도 자기의 적성과 비전을 뚜렷이 갖고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에 맞춰 고른다. 대학들의 학과 구성이나 커리큘럼이 비슷하니 서열이 높은 데로 가려는 걸 욕할 수만도 없다. 아예 요즘은 불황시대를 맞아 등록금 없는 대학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주자는 경찰대와 사관학교다. 입시 경쟁률이 20대 1에서 70대 1까지 오락가락 한다.
5월 들어 교육부는 대학평가체제 개선과 재정지원사업 재편 작업을 시작했다. 국정과제뿐 아니라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새 정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장기적 미래까지 내다보고 전략을 짜겠다 한다. 그 기획자문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지 걱정이다. 머리 비고 정치물 어설프게 든 전문가는 절대 안 된다. 청와대 대변인 수준이 아니길 빌 뿐이다.
sniper@cbs.co.kr
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대학의 국어국문학과가 폐지되고 있다. 이번 주 들어 대전의 배재대학교가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한국어문학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학률이 줄고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를 개편하다보니 그리 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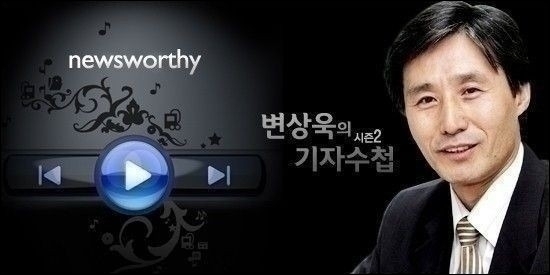
◇종합대학? 취업종편대학입니다
더 살펴보니 최근 대학들의 학과 통폐합에 분명한 흐름이 있다. 심리학과 철학은 엄연히 다른데 '심리철학과'였다. 아예 이번엔 '심리철학상담과'로 바뀐다. 정치언론학과는 뭘까? 권언 유착을 다루나? 이 과는 '정치언론안보학과'로 둔갑할 예정이다. 법학부는 '공무원(?)법학과'로 업그레이드된다. 불문학과 독문학과는 폐지다. 결국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취업준비가 절실하다는 결정이다.
요즘 대학들이 이런다. 순수학문을 외면하고 취업 위주로 학과와 커리큘럼을 조정할거라면 '종합대학교'가 아닌 '취업종편대학'이라고 부를 일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평가에서 취업률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거기에 학부모.학생들도 취업을 위한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면 대학은 교육의 목표와 철학, 깊이보다 뒤떨어진 점수 채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를 역행하는 교수는 바보가 된다. 논문을 하나 더 쓰거나 정부 프로젝트를 하나 더 따오는 게 인정받는 길이다. 아니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나가거나 정치권을 들락거리며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꿈꿀 것이다.
그런데 언론사들도 대학들을 놓고 1등 2등 순위를 매긴다. 이건 뭘까? 언론사가 대학의 순위를 정하려는 이유는 돈벌이 때문이다. 그러다 참다 못 한 대학들이 똘똘 뭉쳐 들고 일어섰다.

그러자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2011년부터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대학생 스스로가 평가한 '대학 순위 - 재학생 대학만족도'가 그것이다. 마치 소비자 고객만족도와 비슷하다. 언론사가 대학을 서열화하는 게 부당하다 하니까 소비자인 대학생이 직접 평가한 거라고 포장을 바꾼 것이다.
이런 대학 서열 평가가 기준이 되어 명문대와 시원찮은 대학으로 구분된다면 타당한 것일까? 이런 대학 서열화가 언론에 보도된 걸 읽고 학부모들은 우리 자식 대학 잘 갔다, 못 갔다하며 자랑도 하고 낙심도 한다. 잘난 부모 시원찮은 부모가 된다.
◇언론은 대학에게 갑(甲)이다
이리 비판하면 대답은 뻔하다. 선진국도 다들 한다고 발뺌을 할 것이다.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1983년 미국의 <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 > 가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대학의 명예와 재산, 특권에 의해 좌우되는 평가라고 비판받는다. 대학 평가 사업은 그 후 <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 > , < 워싱턴 먼슬리 > , < 포브스 > 등 여러 미국 언론사들이 나서며 대학, MBA,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확대됐다.
'더 타임스' 등 영국 신문사들도 대학평가 사업을 한다. 역시 특정 분야 연구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려도 성적은 나쁘고 서열에 매달리게 만든다고 비판 받는다. 신문 팔려고 하는 것이지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릴 이론적 연구나 근거, 조사 방법도 마땅치 않은데 주로 대학의 위세나 여론의 평판, 시류에 따르고, 대학의 고유한 특성들을 평가해 내지 못한다는 게 공통된 비판이다. 그래서 유럽대학연합의 2011년 '국제대학 순위평가와 그 영향 보고서'도 국제 대학순위평가의 여러 위험성을 경고했다.
언론과 기관들이 밝힌 세계 대학 순위를 종합 분석한 이 보고서는 평가기관이 ▲'대학도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평가기준도 단순빈약'하고 이 평가를 ▲'철저한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결정했다. 미국 일부 대학들도 보이콧에 나섰고, 캐나다도 평가에 불참한다는 일부 대학들의 선언이 있었다. 상위에 링크되는 대학들은 대개 모른 척 한다.
우리의 문제는 더 근원적이다. 사회가 학연으로 똘똘 뭉쳐 학벌과 파벌을 구성한다. 갈팡질팡 대입제도로 부실대학이 즐비하다. 학생도 자기의 적성과 비전을 뚜렷이 갖고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에 맞춰 고른다. 대학들의 학과 구성이나 커리큘럼이 비슷하니 서열이 높은 데로 가려는 걸 욕할 수만도 없다. 아예 요즘은 불황시대를 맞아 등록금 없는 대학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주자는 경찰대와 사관학교다. 입시 경쟁률이 20대 1에서 70대 1까지 오락가락 한다.
5월 들어 교육부는 대학평가체제 개선과 재정지원사업 재편 작업을 시작했다. 국정과제뿐 아니라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새 정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장기적 미래까지 내다보고 전략을 짜겠다 한다. 그 기획자문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지 걱정이다. 머리 비고 정치물 어설프게 든 전문가는 절대 안 된다. 청와대 대변인 수준이 아니길 빌 뿐이다.
sniper@cbs.co.kr
'이런저런 이야기 > 다양한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운의 섬' 키프로스 금융 사태, 남 같지 않네… (0) | 2013.06.30 |
|---|---|
| 앉으면 죽산, 일어서면 백산…동학혁명 119주년 (0) | 2013.06.30 |
| 오키나와, 식민지에 총알받이에 군사기지로 (0) | 2013.06.30 |
| '고졸 공무원' 열풍..어느 고교 나왔냐? vs 얼마나 노력했느냐? (0) | 2013.06.30 |
| 통일을 걱정했던 김구 선생 (0) | 2013.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