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휘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영어로는 non-ownership 경제라고 한다.
그렇게 값나가던 지식이 오픈소스화하여 인터넷에 무료로 떠 다니는 현상을 우리는 상상이라고 했던가? 공자 맹자의 지식을 얻으려 수년간 길을 떠나 마침내 공자 맹자를 만나 그들과 나눈 대화들이 논어 등 책으로 제자들의 손에의해 쓰여졌다. 하지만 요즘은 지식을 물으러 길떠나는 사람은 없다. 대학교 교수에게 크게 질문하는 것이 없다. 그저 검색창만 두드리면 되거나 위키피디어 등에 들어가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고 가장 값비싼 지식들이 모두 공짜다.
공유경제로 간다고 자본주의가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재산, 내 자동차, 내 집은 나의 것이지만 세상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진다는 것이다. 무소유 즉 같은 말로 공유라는 것은 내 것도 아니지만 내 것이 아닌것도 아닌 것이다. 함께 사용하며 공유하는 공공의 물건이나 재산이면서 그 재산에 내가 보탬이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농경시대 7,000년 동안 인간의 일터는 농토, 토지, 땅이었다. 땅에서 밭을 일궈서 곡식을 생산하고 식량을 만들었다. 산업시대 200년 동안 인간은 공장을 세우고, 그 주변에 주택단지를 만들어 공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며 살았다. 정보화시대로 들어서자 공장이 사라지고 일터는 인터넷 속 사이버공간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1인 기업이 활성화되자 개인들은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한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변했다. 인터넷이 글로벌홀딩스 기업 역할을 하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연결시켜주며, 필요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접속해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년 후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거의 소멸하고 공유non-ownership가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식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 즉 월드와이드웹, 안드로이드, 우분투Ubuntu: 리눅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포판 등이 공유의 대표적인 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리눅스인 우분투는 2004년 10월 20일에 만들어져 배포되었는데, 당시 데비안 프로젝트Dabian Project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최신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해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스코드를 알면 그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것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에 이용된 기술을 간단히 전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자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극비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 하지만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개발·개량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오픈소스는 많이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즉 내가 만든 지식을 남에게 주면 나에게서는 사라지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나 역시 그 지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되어 퍼져나가면서 개량되고 발전되고 융합되는 시너지효과를 낸다.
그러므로 물건보다 지식을 더 많이 거래하게 되는 미래사회에서 오픈소스로 공급되는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재산을 공유하거나 소유하는 공유경제가 도래하는 것이다.
공유경제가 올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는, 정부나 기업에서 힘이 빠져 똑똑한 개개인에게 권력이 넘어간다는 미래예측의 룰이 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 즉 똑똑한 개개인들이 공유를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요즘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흐름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이 더욱 발전해서 다음 세대는 무료에 대한 개념을 더욱 확대하려 할 것이다.
지구촌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무료이며 또 나눠써야한다는 개념이 들어온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공헌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며, 대부분의 기업은 NGO 기업 국가가 함께 운영하게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소멸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한 지역의 주민들을 먹여살려주는 영주처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기업인이라고 한다. 기업인이 많아야 국민들을 먹여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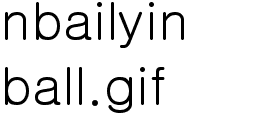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