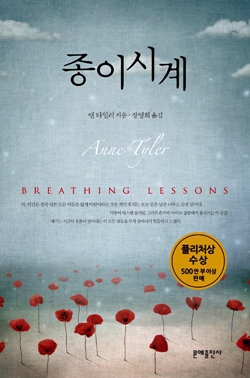
앤 타일러의 <종이시계>는 “결혼한 지 28년 된 부부가 친구 남편의 장례식에 가려고 자동차 여행을 하는 어느 하루의 이야기”다. 덧붙이면 중년 부부가 다 큰 자식들을 모두 떠나보내는 전날 밤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다
매기와 아이러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결혼했다. 매기는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지만, 대학에 입학하기를 거부했다. 도대체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 나부랭이가 무슨 소용 있냐고 보란 듯이 노인요양원에 취직했다. 그날부터 지금껏 은발요양원의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며 두 자식을 키웠다. 남편 아이러는 의대 진학을 미루고 가업인 액자 가게를 물려받았다. 노쇠한 아버지와 아픈 누나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공부보단 돈벌이가 먼저였다. 부양할 가족의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고향에 남기를 선택한 매기와 아이러는 결혼을 약속했다. 부부가 되었지만 부모가 되기엔 미숙한 나이였다. 아무도 매기의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다. 남편 아이러는 가게를 운영하느라 늘 바빴다. 여차하면 고향을 떠날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둘째를 낳고 나서야 그는 의사의 꿈을 포기했는데, 이후부턴 그저 시간을 낭비하며 산다는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은 침묵으로 드러났다.
“전 마지못해 꾸며대는 그런 아버지 중의 하나가 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내키지도 않으면서 동물원에 데려다주거나 맥도널드에 가서 잡담이나 하면서 저녁을 먹거나 하면서 말이에요.”
아들의 말은 아버지를 향한 비난이나 다를 바 없었다. 아들뿐만이 아니었다. 늘 우등생이던 딸은 자라는 내내 가족을 무시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전날, 딸은 남겨진 부모를 걱정하기보다 다시 돌아와야 할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꼼꼼히 짐을 싸는 데 열중했다. 자식들은 작별 인사 없이 그들을 떠났다.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이, 다신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처럼. 이젠 내 뜻대로만 살 거야, 그런 다짐이 읽히는 얼굴로 떠났다. 마치 매기와 아이러가 같은 다짐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것처럼.
떠났다고 말하자니 버려졌다는 느낌이 드는 작별이었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자니 도망가버렸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아선 통째로 사라질 것만 같은 이별이었다. 자식들의 독립은 자연스러운 통과의례임에도, 매기 부부는 상처받았다. 친구는 매기에게 “왜 너는 항상 모든 것을 미화하려고 드냐”고 물었다. 매기는 사람들이 진심을 숨겨서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 거라고 믿으며 살았다. 진심의 내용은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을 미화하려고 드는 마음이 지나친 간섭과 참견으로, 타인의 인생을 마음대로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로 이어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남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두 팔 걷어붙이고 도운 선행이었다.
“우리는 여생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죠?”
깊은 밤, 매기는 아이러의 어깨에 기대어 물었다. 아이들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은 매기도 아이러도 준비된 바가 없었다. 이 부부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꿈꿨던 미래, 도대체 그건 언제 사라졌는지, 매기는 새삼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삶이 아주 끝난 뒤에야 열어보는 그 자루
잃어버린 물건들의 목록이 잇따라 생각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목걸이, 손에 익은 열쇠고리, 즐겨 입던 원피스. 정작 매기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은 없었다.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물건들을 하찮게 취급하다 결국 잃어버린 사람들은 매기가 끔찍이 사랑했던 두 아이였다.
신이 생전에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준다면, 어떤 물건은 신이 일부러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내 딴에는 잘 챙겨둔 물건이 부지불식간에 없어진 적이 더러 있었다.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 집약된 물건, 이를테면 반지나 사진 같은 거. 갖고 있자니 무의미하고 버리자니 무정해서 눈에 안 띄는 곳에 두었는데, 찾아보면 제자리에 없는 물건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라졌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 없는 물건들.
시계는 둥글고, 시간은 바퀴처럼 굴러간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사는 모양새는 달라도 사는 일은 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신이 우리에게 내준 자루를 뒤집으면 그 안의 물건들은 엇비슷할 것이다. 상실과 이별의 기억이 우르르 쏟아질 것이다.
솔직히 의심스럽다. 삶이 아주 끝난 뒤에야 열어보는 그 자루에 내게 값진 것이 남아 있기나 할는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천국 대신 내일을 더 기대하며 살았을는지,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신의 호의를 거절할 자신은 없다. 정말 되찾고 싶은 건 자루 속에 없을 것임을, 신도 나도 이미 알고 있다. 염치없지만, 신이 있다면 미리 부탁드린다. 대신 버려주기를. 이 쓸쓸한 기억을 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인다.
황현진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