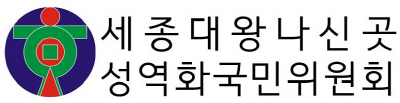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8
<!--[if !supportEmptyParas]--> <!--[endif]-->
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6-28쪽.
<!--[if !supportEmptyParas]--> <!--[endif]-->
네 말이 옳다마는 무슨 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오로지 정욕(情欲)을 금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니, 노성(老成)하여지면 이렇지는 아니할 것이다. 爾言是矣然豈有他哉專以不禁情欲耳若老成則將不如是
- 《세종실록》 제6권 세종 원년 12월 21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이 글은 지신사(知申事) 원숙(元肅)이 세종대왕께 아뢰기를,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전하(殿下)의 우애(友愛)가 지극함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몹쓸 일만 하여 주상의 덕(德)을 손상시키니, 매〔騰〕와 개〔犬〕와 마필(馬匹)을 거두어들여 앞일을 방비하여야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의 몸을 보전(保全)하지 못할 것이니, 전하께서 비록 보전하려 하여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므로, 세종대왕께서 말씀한 것이니,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형제간의 우애가 어떠하였나를 알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양녕 대군은 천성이 유람하며 풍류를 즐기는 기질이라 거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하여 신하들로부터 죄주라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럴 때마다 세종대왕은 혹시나 양녕에게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뒤로 보살펴 일생을 고이 지내게 하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잠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젊어서는 주색(酒色)에 대한 욕망을 이기기가 어렵고, 나이가 들어서는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 는 것은 인간의 본성(本性)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극기(克己: 자기를 이기는 것)의 수양(修養)이 필요한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람의 마음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으면 곧 움직이게 마련인데,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요한 정적(静的)인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은 욕망을 극복하고 이성을 되찾는 자기 수양의 공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정욕(情欲)을 이기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렇듯 세종대왕은 인간의 모든 죄악이 정욕을 금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간파(看破)하고 교화(教化)에 힘쓰셨으니,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근본을 둔 유교의 이념을 가르쳐 인간의 마음을 순화(醇化)시켜 그 정욕을 억제하게 하는 한편 불교의 힘도 빌려 인간의 마음을 정화(淨化)시키는 데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수 창제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가지고 불경(佛經)을 언해(諺解)하고 경서(經書)를 번역하게 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