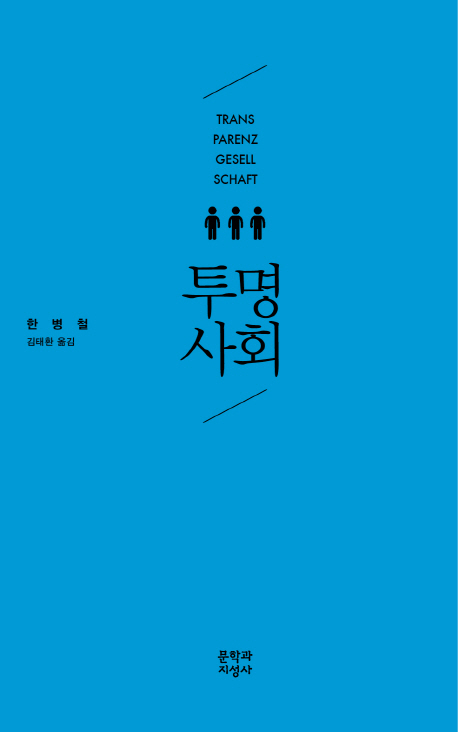【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오늘날 '투명성'은 중요한 화두다.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투명성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정보의 자유,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의 발달로 정보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개되고 무제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투명한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믿음이 생겼다.
'투명사회'의 저자 한병철(베를린예술대학 교수)은 긍정적인 가치로 간주해온 투명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투명사회는 신뢰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통제사회라고 주장한다. 투명사회는 우리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상태, '디지털 파놉티콘'으로 몰아넣는다. 이 사회의 거주민들은 권력에 의해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고 전시함으로써, 심지어 그것을 '자유'라고 오해한 채 스스로 '디지털 파놉티콘'의 건설에 동참한다.
이곳에서는 빅브라더와 파놉티콘 수감자의 구분이 사라진다. 서로 격리되고 고립되돼있는 벤담식 파놉티콘의 수감자들과는 반대로 현대 통제사회의 거주민들은 네트워크화돼 서로 맹렬하게 커뮤니케이션한다. 고립을 통한 고독이 아니라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를 고독으로 밀어넣는다. 투명성은 모든 것을 '정보'로 바꿔버림으로써, 우리를 모든 것이 완전히 털리고 발가벗겨진 '유리 인간'의 상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모두가 같아지는 상태로 나아가게 만든다.
한병철은 투명성이란 모든 사회적 과정을 장악해 근원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끌어들이는 시스템적 강제력,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한다. 오늘날 사회 시스템은 모든 사회적 과정을 신속하게 조작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요한다. 가속화의 압력은 부정성의 해체와 궤를 같이 한다. 투명성은 낯선 것과 이질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가속한다. 투명사회에서는 점차 타자가 소멸하고 나르시시즘의 경향이 강화된다.
또한 투명성 속에는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 있지 않다. 투명성은 시스템 외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최적화할 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치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건드리지 않은 채 그저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관리하는 역할로 축소되고 만다. 선거와 쇼핑은 비슷해지고, 통치도 마케팅에 가까워진다.
한병철은 투명성에 관한 사유를 일상과 정치의 영역을 넘어 시각적, 인식적 차원으로까지 밀고 나간다. 모든 것을 손쉽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시각적, 인식적 부정성의 영역, 즉 가려진 것들, 비밀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직접 공개하는 포르노적 사회,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전시사회가 성립한다.
저자는 모든 것이 겉이 돼가는 사회, 진리는 없고 정보만이 있는 사회, 낯선 타자와 직접 맞닥뜨릴 기회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숙하게 길든 것만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나르시시즘적 사회의 모습을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제시한다. 김태환 옮김, 235쪽, 1만2000원, 문학과지성사
jb@newsis.com
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이런저런 이야기 > 책 속에 길이 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경계를 지나면 당신의 승차권은 유효하지않다--로맹가리 (0) | 2014.03.16 |
|---|---|
| 단속사회 --- 엄기호 (0) | 2014.03.16 |
| 피로사회 -- 현병철 (0) | 2014.03.16 |
| 무슨 '사회'가 이리 많나 (0) | 2014.03.16 |
| 빙긋이 웃음 자아내는 쌍둥이의 이불 소동--< 쌍둥이는 너무 좋아 > 염혜원 글·그림, 비룡소 펴냄 (0) | 2014.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