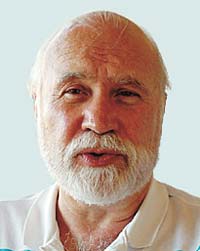한때 미국 5위권 대도시로 번영을 구가했던 디트로이트시가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기업·인구 유출의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1701년 프랑스 탐험가 앙투안 캐딜락이 ‘디트로이트(d‘Etroit·해협)’라고 명명한 정착촌을 세우면서 시작된 312년의 역사에도 음울한 그림자가 뒤덮였다. 앙투안 캐딜락의 이름에서 따왔던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GM의 자존심인 캐딜락 브랜드도 상처를 입었다. 만성적 재정적자의 중병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디트로이트시는 혁신과 개혁이 없는 한 파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문 닫은 ‘콜맨 영 시정센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건물을 폐쇄합니다.’ 지난 12일 오후 디트로이트시 우드워드와 제퍼슨 애비뉴에 위치한 ‘콜맨 영 시정센터(Coleman Young Municipal Center)’의 1층 회전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경비원 한 명만 잠시 입구를 지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떴다. 문에는 빨간색 건물 폐쇄 공고가 나붙었고, 유리창으로 들여다본 로비는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버몬트산 흰색 대리석으로 외벽을 장식한 21층 높이의 건물은 1954년 완공 이후 60년 동안 디트로이트시 행정의 중심이었다. 시청 부서의
사무실과 회의실, 재판정이 있었고 공무원연금 관련 부서도 이곳에 위치했다.
하지만 월급을 지급할 돈이 없어 시 공무원들은 출근을 못하고 있고, 치안
유지와 긴급구조의 비상업무만 간신히 돌아간다. 범죄신고를 해도
경찰은 1시간이 지나야 출동하기 일쑤고, 앰뷸런스를 불러도 30여 분 넘게 기다려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을 놓고 보수 대 진보의 논쟁이 펼쳐졌다. 짐 릴레이라는 네티즌은 “디트로이트시의 몰락에 대해 비판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콜맨 영 시장”이라며 “디트로이트시가 재앙으로 가는 길을 그가 깔아 놓았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영 시장은 시의 회생을 위해 노력했던 ‘위대한 전사’”라고 맞섰다. 일부는 GM의 폴타운
공장 유치, 시립병원 건립, 강변 콘도
건설 등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 시장이라는 옹호론도 제기됐다.
흑인인 영 시장은 1974∼1993년까지 20년 동안 시장으로 재직했다. 청년시절 포드자동차 근무 시 급진 노조 활동으로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운동가 출신
인사다. 1940, 1950년대에는 전미자동차노조(UAW)에 몸담았고, 한때 공산주의 조직에도 가담해 연방수사국(FBI)의 감시까지 받았다. 백인들이 디트로이트시를 떠나고 다수 인종으로 떠오른 흑인들의 지지를 얻은 그는 시장에 올라 초기에 연금제도 개혁을 시
운영위원회에 건의했다.
하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금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미 프로농구(NBA) 스타 출신인 현 데이브 빙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네 명의 흑인 정치인들이 줄곧 시장에 당선됐지만 재정을 돌보지 않고 사회복지 정책을 유지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 만연된 탈세와 ‘눈덩이’연금 부담
“디트로이트시에서 세금 제대로 내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미시간주 워렌에서 만난 교민 A(41) 씨는 디트로이트시에서는 탈세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첵 캐싱(Check-cashing)’.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개인수표인 ‘첵’으로 지급한다.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대신, 적당한 선에서 지급액의 타협이 이뤄진다. 근로자는 첵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다. 고용주들은 인건비가 적게 나가고, 근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님들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첵 캐싱으로 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실업자들이다. 연방정부와 시정부에 실업자로 분류돼 각종 사회복지제도 수혜대상이 된다. 연평균 개인소득이 1만4000달러(약 1500만 원) 미만이거나 4인가구 기준으로 2만8668달러(약 3000만 원)를 넘지 않으면 푸드 스탬프도 받는다.
연방정부와 시정부가 일정금액을 분담하는 푸드 스탬프를 받으면 1인당 월평균 최대 200달러의 식료품을 무료로 살 수 있다. 앞으로 시행예정인 의료보장제도인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도 챙길 수 있다. A 씨는 “디트로이트시에서는 편하게 살려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시의 최대
고민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무원연금 지금액이다. 전체 180억 달러의 부채 중 상·하수도 부서 채권이 59억 달러, 지방정부 채권이 29억 달러, 펀드 조성이 안 된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미래 연금 지급액이 35억 달러 규모다. 더구나 3만여 명에 달하는 은퇴 공무원들에게도 무려 57억 달러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직과 퇴직 공무원의 비율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39% 대 61%를
기록해 ‘소수의 현직자가 다수의 퇴직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간 시정부는 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지만 퇴직자들은 법정 투쟁을 벌일 기세다. 1980년대에 연간 20억 달러 안팎을 오르내렸던 세수는 2000년대 들어 10억 달러를 조금 넘는 규모로 주저앉아 자체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줄줄이 대기 중인 ‘파산의 도시’
파산의 그림자는 디트로이트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도 드리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미국 최대 대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 역시 공무원연금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카고의 펀드 조성이 안 된 공무원연금 지급 채무는 190억 달러에 달한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람 이매뉴얼 시장은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뛰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미 서북부에서 시애틀에 이어 두 번째로 커다란 대도시인 오리건주 포틀랜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네바다주 오마하의 연금 지급 부채도 14억 달러다. 필라델피아, 해리스버그, 휴스턴도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부채와 산업활동 위축,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의 고질병을 앓고 있다.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외면한 미국의 도시들은 파산이라는 선심정치의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 글·사진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