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농업이 수출용인가?…'생명산업'으로 기수를 돌려라
[변상욱의 기자수첩] 노컷뉴스 변상욱 입력 2013.02.01 12:03[CBS 변상욱 대기자]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다음 주 국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농업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지금까지 내놓은 골격을 보면 걱정스럽다.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이 가공·유통·관광을 종합한 산업으로 만들자. △지역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다. △재해보험과 지역보장 확대. △첨단생산·유통시스템 도입, 농업분야 연구개발(R & D) 투자 강화, 종자산업 육성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한심하다 할 농업정책을 답습하지 말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해보자. 인수위를 통해 농정당국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뭐든 팔아 돈 벌어'가 MB정부의 정책기조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은 잘 만들어 비싸게 팔면 부자 될 텐데 왜 그리 못하는 지 답답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방송도 비즈니스와 수출 위주로 생각하는 마당에 농업이라고 다를리 없다. 그러나 과연 누가 답답한 걸까?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농작물이 100이라면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20을 겨우 넘긴다. 그렇다면 농작물은 무지하게 비싸야 한다. 하지만 값싼 수입 농작물로 가격을 유지해 왔다. 그로인해 농민 대다수는 죽어라 일하지만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간다. 이를 수치로 살펴보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농업에 쓰는 비료농약 등 투입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하면 농사 투입재 가격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의 1.8배에 이르고, 농기계 가격은 1.3배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4배로 한참 뒤쳐져 있다. 그렇다면 농업이 게으름을 피웠을까? 그건 더욱 아니다. 농업부문 생산성은 비농업부문과 비교해 1.5배로 오히려 월등하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 대비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시작 전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95%까지는 쫓아가 있었다. 이제는 58%로 떨어진 형편이다. 소비자들로서는 우리 농산물도 열심히 팔아줬는데 왜 그리 소득이 안 오르나 생각할 지 모르겠다. 그것은 그나마 농촌에서 나오는 이득이 가난한 소농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농 대농에게 쏠린 때문이다.
이래도 농촌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제조업에서 쓰는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농촌에서는 잔혹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이뤄져 온 셈이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집단해고되면 이슈화되지만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떠밀려 나는 건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여기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외면한 것은 아니다. 농촌을 살린다고 재정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체제와 목표를 정비하지 않고 외양만 요란하게 투입하다보니 효과도 적고 시장은 왜곡되고 도덕적 해이만 커져 농촌에 대한 불신마저 키웠다.
◇농업은 수출용인가, 생명 가꾸기인가?
비싸게 팔 농작물을 생산해 수출을 도모하는 쪽으로 농업정책을 밀고가면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걸까? 값나가는 명품 농작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일까? 순수 국내 농산물 수출 규모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0.7%에 불과하다.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벌면 얼마나 더 벌 수 있으며 가난한 농가들이 그걸 해내고 거기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까? 식물공장 이야기가 나온다. 온도와 물, 산도와 이산화탄소 등 재배조건을 마음대로 조절해 땅이 아닌 박스에 심고, 햇빛은 LED조명으로 대신하고 자동화된 기계가 척척 알아서 재배하는 식물공장이 세워지면 생산량이 엄청 늘어난다고 한다. 석유와 자본을 퍼붓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이다.
값비싼 농작물을 생산해 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석유'이다. 화학물질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석유가 풍부하고, 땅도 넓고, 자본도 넉넉하고, 사람도 많은 나라가 농작물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지구촌이 겪고 있는 식량위기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자. 10여 년 전부터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사짓는데 쓸 석유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올랐다. 다시 내릴까? 어림도 없다. 세계 농작물 가격은 석유가격의 인상과 비료.농약 가격의 상승, 거기에 겹쳐진 선진국들의 극심한 가뭄으로 계속 치솟고 있다.
선진국의 가뭄도 지구온난화에 연계되어 구조적인 것이다. 해결되지 않는다. 농사짓는 비용은 오르고 식량은 부족해 국제곡물가도 오를 것이 뻔하다.
그런데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강 주변의 농지들을 훼손시켰다. 강물도 오염됐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좋아지긴 커녕 낙동강 물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더럽혀졌다는 보도가 계속된다. 이러면서 농업을 다른 나라를 넘볼 수출산업으로 키워가자는 게 올바른 비전일까? 비싼 농작물을 심고 가꿔 수출에 주력하자는 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이 가당한 것일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부족하다. 경작할 땅은 신도시, 주거단지, 골프장 개발로 줄어만 간다.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정권교체와 함께 한국 농업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 농업의 비전은 무엇인가? 고도 성장률과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인가? 아니면 환경과 식량을 지키는 내 땅의 생명산업인가?
sniper@cbs.co.kr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다음 주 국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농업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지금까지 내놓은 골격을 보면 걱정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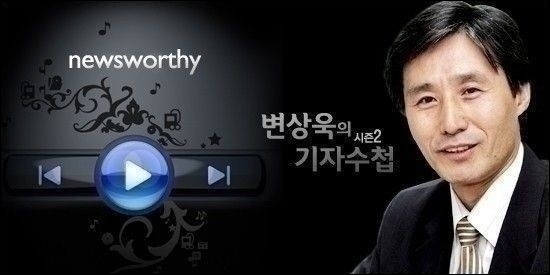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한심하다 할 농업정책을 답습하지 말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해보자. 인수위를 통해 농정당국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뭐든 팔아 돈 벌어'가 MB정부의 정책기조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은 잘 만들어 비싸게 팔면 부자 될 텐데 왜 그리 못하는 지 답답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방송도 비즈니스와 수출 위주로 생각하는 마당에 농업이라고 다를리 없다. 그러나 과연 누가 답답한 걸까?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농작물이 100이라면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20을 겨우 넘긴다. 그렇다면 농작물은 무지하게 비싸야 한다. 하지만 값싼 수입 농작물로 가격을 유지해 왔다. 그로인해 농민 대다수는 죽어라 일하지만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간다. 이를 수치로 살펴보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농업에 쓰는 비료농약 등 투입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하면 농사 투입재 가격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의 1.8배에 이르고, 농기계 가격은 1.3배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4배로 한참 뒤쳐져 있다. 그렇다면 농업이 게으름을 피웠을까? 그건 더욱 아니다. 농업부문 생산성은 비농업부문과 비교해 1.5배로 오히려 월등하다.

이래도 농촌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제조업에서 쓰는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농촌에서는 잔혹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이뤄져 온 셈이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집단해고되면 이슈화되지만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떠밀려 나는 건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여기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외면한 것은 아니다. 농촌을 살린다고 재정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체제와 목표를 정비하지 않고 외양만 요란하게 투입하다보니 효과도 적고 시장은 왜곡되고 도덕적 해이만 커져 농촌에 대한 불신마저 키웠다.
◇농업은 수출용인가, 생명 가꾸기인가?
비싸게 팔 농작물을 생산해 수출을 도모하는 쪽으로 농업정책을 밀고가면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걸까? 값나가는 명품 농작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일까? 순수 국내 농산물 수출 규모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0.7%에 불과하다.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벌면 얼마나 더 벌 수 있으며 가난한 농가들이 그걸 해내고 거기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까? 식물공장 이야기가 나온다. 온도와 물, 산도와 이산화탄소 등 재배조건을 마음대로 조절해 땅이 아닌 박스에 심고, 햇빛은 LED조명으로 대신하고 자동화된 기계가 척척 알아서 재배하는 식물공장이 세워지면 생산량이 엄청 늘어난다고 한다. 석유와 자본을 퍼붓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이다.

지구촌이 겪고 있는 식량위기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자. 10여 년 전부터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사짓는데 쓸 석유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올랐다. 다시 내릴까? 어림도 없다. 세계 농작물 가격은 석유가격의 인상과 비료.농약 가격의 상승, 거기에 겹쳐진 선진국들의 극심한 가뭄으로 계속 치솟고 있다.
선진국의 가뭄도 지구온난화에 연계되어 구조적인 것이다. 해결되지 않는다. 농사짓는 비용은 오르고 식량은 부족해 국제곡물가도 오를 것이 뻔하다.
그런데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강 주변의 농지들을 훼손시켰다. 강물도 오염됐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좋아지긴 커녕 낙동강 물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더럽혀졌다는 보도가 계속된다. 이러면서 농업을 다른 나라를 넘볼 수출산업으로 키워가자는 게 올바른 비전일까? 비싼 농작물을 심고 가꿔 수출에 주력하자는 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이 가당한 것일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부족하다. 경작할 땅은 신도시, 주거단지, 골프장 개발로 줄어만 간다.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정권교체와 함께 한국 농업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 농업의 비전은 무엇인가? 고도 성장률과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인가? 아니면 환경과 식량을 지키는 내 땅의 생명산업인가?
sniper@cbs.co.kr
'이런저런 이야기 > 다양한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징기스칸의 교훈 (0) | 2013.07.05 |
|---|---|
| 변혁, 바람은 밑에서 물은 아래로… (0) | 2013.06.30 |
| 대한민국에서 1원이면 뭐든 산다? (0) | 2013.06.30 |
| 새마을운동으로 '헌 나라' 만들려는가? (0) | 2013.06.30 |
|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 자유구역'으로 바뀐 이유 (0) | 2013.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