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미래창조는 숲 속에 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노컷뉴스 입력 2013.04.05 10:03[CBS 변상욱 대기자]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4월 5일 식목일이다. 지난 3월 21일은 '세계 산림의 날'(International Day of Forests)이었다. 지구의 남반구·북반구가 식목 시기가 전혀 다르지만 북반구는 나무 심을 시기가 자꾸 빨라진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제주도와 남부 해안은 2월 하순, 강원도도 3월 중순이면 나무를 심을 수 있어 식목일은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적당해졌다. 새 정부가 식목일을 다시 정한다면 4월5일 식목일은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상징적으로 4월 5일을 유지하되 지역별로 생태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
◇ 숲은 권리이고 책임이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림녹화를 시작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한다. 국제식량농업기구가 1982년 공식보고서에서 인정했고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
1972년 7,000만㎥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숲의 나무 양이 2010년에는 8억㎥로 10배 이상 늘었다. 나무 심기도 전략과 쇄신이 필요한 시대이다. 동백꽃이 서울에서도 핀다. 대구의 자랑 사과나무는 강원도 양구 지역까지 올라왔다. 제주감귤은 전남 남쪽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우리 땅에 자라는 나무들을 보호하고 유전자를 보존해야 한다.
산림의 가치는 임업생산, 생태환경, 산림복지, 토지자원 4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림이 재생가능한 자연 자원으로 녹색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업에서 수익이 나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아직 16%에 그쳐 수입의존도가 높다. 나무도 잘 골라 심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숲을 잘 가꾸어 고급목재 생산기반을 다져야 한다. 임업분야에 첨단기술을 융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숲에서 자라는 식물 중 미래유망품목을 찾아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한다.
숲의 식물들은 의약품, 식량, 색소, 향료 등의 원료가 된다. 그 중 약용으로 이용되는 물질은 현재까지 36,000여종이 밝혀져 있고 해마다 약 1,600여종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한반도에는 약 900여종의 약용식물이 자라는 것으로 파악돼 있다.
오래된 나무를 베어야 겨우 조금 얻는 항암제의 경우 나무의 세포를 떼어내어 배양탱크에서 키워 항암제를 추출한다. 기업이 맡기도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산림 제품을 만들어 팔 생산시설, 유통시설, 브랜드와 마케팅 등등 할 일이 많다.
산림은 책임이자 권리이다. 국민은 우거진 숲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산과 숲, 도시 녹지가 두루 갖춰지고 접근해 머물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산림청은 4월 한 달 동안 '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라는 주제로 전국에 '5000만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내 나무를 어딘가에 한 그루씩 심어 종종 보러가고 가꾸자. 바다에서도 식목일이면 풀을 심는다. 제주해경이 벌이는 바다 식목 행사가 있다. 바다 속에 해조류를 심는 것. 지구온난화와 연안바다 개발 등으로 인해 바다도 백화현상이 일어나며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감태를 심고 살기 어려운 곳에 남아있는 소라 성게 전복을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주는 작업을 벌인다.
◇ 나무와 숲을 편파적으로 대하자
지구 면적 중 산림은 31%. 해마다 1,300만 ha의 산림이 사라진다.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땅 위에 사는 생물의 75%가 산림에 서식하는데 아마존 등 열대우림이 마구 파헤쳐지는 건 지구촌의 비극이다. 신림이 훼손되는 배경은 어디나 마찬가지. 돈 벌고 먹고 살려다 보니 난개발을 일삼는 것이다.
산림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며 줄이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일본은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6% 중 3.8%를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량으로 충당했다. 우리나라도 산림의 탄소흡수량으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억2400만t의 19%를 감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파헤쳐가다가는 어렵다.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떨어지면 의무감축량을 결국 돈으로 메워야 한다. 숲은 많고 공장은 적은 뉴질랜드는 산림탄소가 남아 내다 팔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연계한 북미 탄소거래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영국, 브라질 등도 산림탄소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산림탄소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산을 잘 가꾼 사람이 있다면 목재나 산나물을 거둬 파는 것 외에 탄소량을 인증서 형태로 바꿔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우리가 외국에 숲을 가꾸면 목재 뿐 아니라 산림탄소도 얻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된다.
숲은 생명이고 미래의 터전이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란 말은 잘못이다. 보존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우리의 산림을 지켜가야 한다.
sniper@cbs.co.kr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4월 5일 식목일이다. 지난 3월 21일은 '세계 산림의 날'(International Day of Forests)이었다. 지구의 남반구·북반구가 식목 시기가 전혀 다르지만 북반구는 나무 심을 시기가 자꾸 빨라진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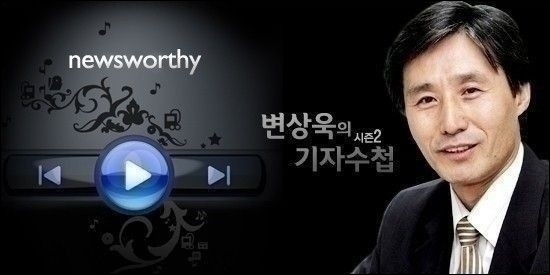
◇ 숲은 권리이고 책임이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림녹화를 시작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한다. 국제식량농업기구가 1982년 공식보고서에서 인정했고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
1972년 7,000만㎥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숲의 나무 양이 2010년에는 8억㎥로 10배 이상 늘었다. 나무 심기도 전략과 쇄신이 필요한 시대이다. 동백꽃이 서울에서도 핀다. 대구의 자랑 사과나무는 강원도 양구 지역까지 올라왔다. 제주감귤은 전남 남쪽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우리 땅에 자라는 나무들을 보호하고 유전자를 보존해야 한다.
산림의 가치는 임업생산, 생태환경, 산림복지, 토지자원 4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림이 재생가능한 자연 자원으로 녹색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업에서 수익이 나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아직 16%에 그쳐 수입의존도가 높다. 나무도 잘 골라 심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숲을 잘 가꾸어 고급목재 생산기반을 다져야 한다. 임업분야에 첨단기술을 융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숲에서 자라는 식물 중 미래유망품목을 찾아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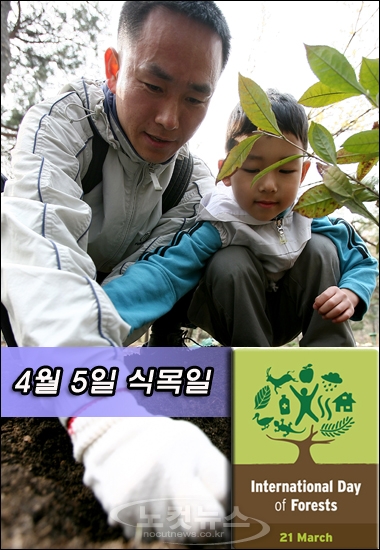
오래된 나무를 베어야 겨우 조금 얻는 항암제의 경우 나무의 세포를 떼어내어 배양탱크에서 키워 항암제를 추출한다. 기업이 맡기도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산림 제품을 만들어 팔 생산시설, 유통시설, 브랜드와 마케팅 등등 할 일이 많다.
산림은 책임이자 권리이다. 국민은 우거진 숲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산과 숲, 도시 녹지가 두루 갖춰지고 접근해 머물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산림청은 4월 한 달 동안 '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라는 주제로 전국에 '5000만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내 나무를 어딘가에 한 그루씩 심어 종종 보러가고 가꾸자. 바다에서도 식목일이면 풀을 심는다. 제주해경이 벌이는 바다 식목 행사가 있다. 바다 속에 해조류를 심는 것. 지구온난화와 연안바다 개발 등으로 인해 바다도 백화현상이 일어나며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감태를 심고 살기 어려운 곳에 남아있는 소라 성게 전복을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주는 작업을 벌인다.
◇ 나무와 숲을 편파적으로 대하자
지구 면적 중 산림은 31%. 해마다 1,300만 ha의 산림이 사라진다.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땅 위에 사는 생물의 75%가 산림에 서식하는데 아마존 등 열대우림이 마구 파헤쳐지는 건 지구촌의 비극이다. 신림이 훼손되는 배경은 어디나 마찬가지. 돈 벌고 먹고 살려다 보니 난개발을 일삼는 것이다.
산림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며 줄이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일본은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6% 중 3.8%를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량으로 충당했다. 우리나라도 산림의 탄소흡수량으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억2400만t의 19%를 감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파헤쳐가다가는 어렵다.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떨어지면 의무감축량을 결국 돈으로 메워야 한다. 숲은 많고 공장은 적은 뉴질랜드는 산림탄소가 남아 내다 팔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연계한 북미 탄소거래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영국, 브라질 등도 산림탄소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산림탄소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산을 잘 가꾼 사람이 있다면 목재나 산나물을 거둬 파는 것 외에 탄소량을 인증서 형태로 바꿔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우리가 외국에 숲을 가꾸면 목재 뿐 아니라 산림탄소도 얻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된다.
숲은 생명이고 미래의 터전이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란 말은 잘못이다. 보존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우리의 산림을 지켜가야 한다.
sniper@cbs.co.kr
'이런저런 이야기 > 볼거리 좋은 글 아름다움 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페북 친구들이 보내주신 생일선물 좋아요 (0) | 2013.07.03 |
|---|---|
| 은총의 나라 베네수엘라…그러나 은총만으로 잘 사는 건 아니다 (0) | 2013.06.30 |
| 믿을 수 없는 신기한 풍경 ---눈치료 하는경치 (0) | 2013.06.28 |
| ♡어느 버스 운전기사의 아픈 사연♡ (0) | 2013.06.22 |
| 뱃살다이어트 방법 (0) | 2013.06.20 |





